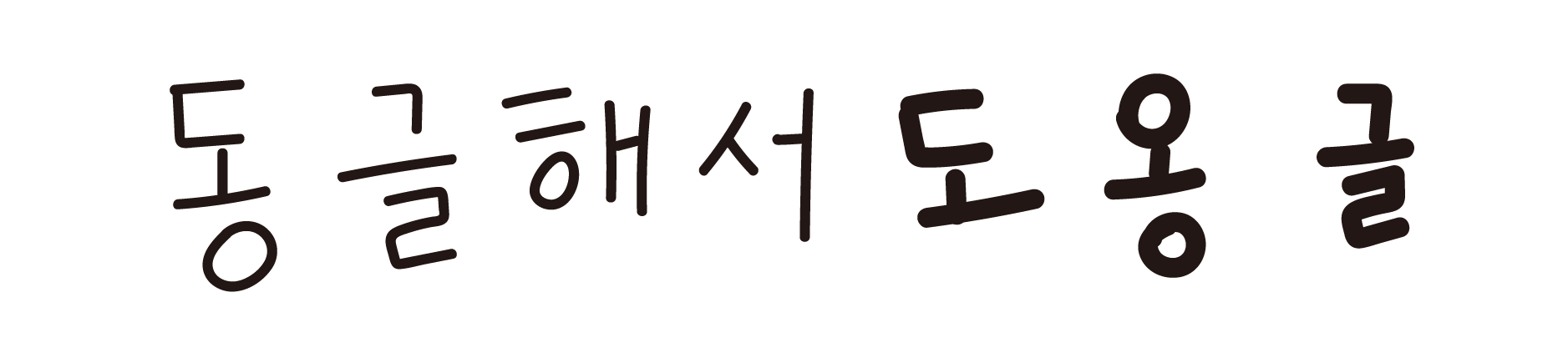2019. 6. 12. 00:11ㆍ도옹글 생각/미디어 리뷰
세바시 891회차 강연자 장혜영씨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원하는 사회는, 단 한명의 장애인도 격리 당해 살지 않고 모두가 사회에서 사는 사회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격리
지나칠 뻔 했다가 영상을 한번 더 보고는 글로 남기게 되었다.
보호라는 이름의 격리.
세가지 단어가 조합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강연자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더욱 느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봄으로서 수긍하게 되는 말이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선택과 경험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산건 아닌지.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림을 상상했기에 어려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이쯤에서 비장애인의 삶을 한번 떠올려보자. 비장애인인 내가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수 많은 자립의 기준들, 경제적 자립, 심리적 자립과 같은 어떤 부분에서도 나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면서 지낸다. 또한 약해지는 마음을 수없이 붙잡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처럼 20대 중반인 나도 여전히 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 책, 영화에서 오는 경험들을 통해 배워나가는 중이다.
자립이란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구도 혼자서 해내는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장애인들의 자립도 비장애인의 자립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장혜영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립이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적절히 의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끝없이 찾아나가는 여정이라고. 세상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면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같을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에게도 경험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다.
본인의 능력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며 마침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들은 모두 사회속에서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이 사회속에서 자유롭게 누렸던 수 많은 경험의 기회를
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크게 멈칫했던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바쁘게 지하철을 타는 아침시간, 여유롭게 영화를 보러가는 주말, 바람을 쐬며 산책하던 한강에서도. 그 어떤 일상에서도 나는 장애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쩌면 사회의 구조나 실제적인 환경의 제약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시킨 스웨덴
이 강연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놓은 나라가 있다고 강연자는 말한다.
바로 스웨덴인데, 70년대만 해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았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시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장애인의 보호자들도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을 느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 199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스웨덴 정부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시키게 된다. 국가가 시설을 사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시킬 만큼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날이 오기까지 수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속의 한 인물을 소개 시켜 주었는데, 칼 그루네발트 라는 박사는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비인권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한다.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실제로 편견임을 입증해 나가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담는 이유는, 그 시절의 칼 그루네발트 박사처럼 이제는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다.
내가 말하는 사회는 사실 제도가 움직이고 정책과 법이 변하는 그런 거창한 사회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갖지 않은 이유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사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회다.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엔 어떤 누구도 격리 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그날을 여전히 막연하게 꿈꿔본다. 그리고 그 막연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흐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걷어내고 말끔한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나는 이 글을 쓴다.
'도옹글 생각 > 미디어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유퀴즈온더블럭 feat.공감 (0) | 2019.08.11 |
|---|